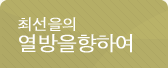지난해 '기후난민' 1천700만명 이상..선진국들은 외면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해 '기후난민' 1천700만명 이상..선진국들은 외면
연합뉴스 입력 2015.12.08. 16:12(뉴델리 AP=연합뉴스) 방글라데시 남부 메그나 강과 벵골만이 만나는 볼라섬에 사는 농부 아즈마드 미야(36)는 이제 어딘가에 정착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는 3년전 집이 바닷물에 잠기면서 빈털터리가 됐다. 소작농 일을 하면서 입에 겨우 풀칠을 하는 상황이다.
미야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였다. 내가 지구에 잠시 왔다 가는 것처럼 우리 집도 언제나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푸념했다.
마셜군도에 거주하는 카를론 제드카이아는 올해 11살인 딸 아이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집이 언제 바닷물에 잠길지 걱정이다.


그는 "이곳에 머문다면 내 딸아이에게 미래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무엇인가 한다면 여기서도 딸아이에게 미래라는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딸은 어디론가 이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이웃들은 30년전 체결된 협약에 따라 자신들을 받아주고 일자리도 제공해주는 미국 아칸소주로 떠났다.
미야나 제드카이아 처럼 온난화의 재앙을 겪고 있거나 코앞에 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내난민감시센터'(IDMC)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천93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90% 이상은 이른바 기상 현상과 관련이 있다.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은 대부분 아직 자국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안전한 삶의 터전을 찾아 국경을 넘으려는 욕구는 점점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전쟁이나 인종 및 종교적 박해가 아닌 기후 변화를 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난민' 지위를 주지 않는다.
환경 재앙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도 없고, 유엔난민기구(UNHCR)의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언제든 본국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기후 문제로 난민 신청을 한 남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 출신 남성을 올 초 추방했다. 세계 첫 환경 난민 사례였다.
이처럼 환경 난민 문제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
'신기후체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2주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국조차도 기후 난민 문제를 신기후체제에 포함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 스위스 등도 같은 입장이다.
구호기구인 액션에이드 인터내셔널의 국제정책국장인 하르지트 싱은 "기후난민 문제는 빠르게 확산하는 재앙이 됐다"며 "그러나 국제사회는 조만간 발생할 기후난민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기후 난민'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글라데시 이재민 구호단체인 COAST의 레자울 카림 초우더리는 "유엔의 난민 규약을 손 볼 때가 됐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기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이주기구(IOM)의 기후변화 및 이주 전문가인 마리암 트라오레 차잘노엘은 "선진국은 수백만명의 기후난민이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요구할까봐 겁을 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